종교별 장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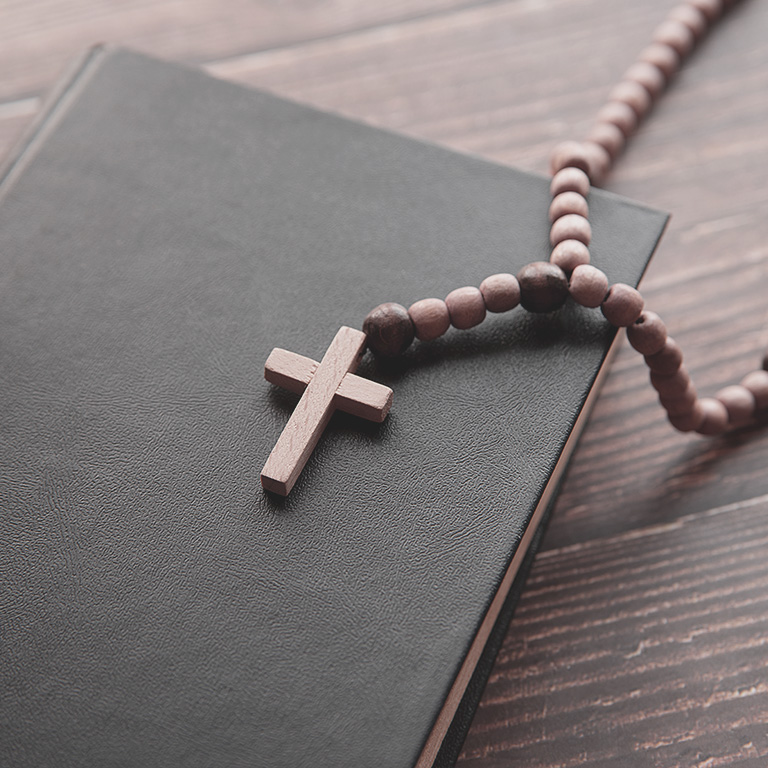
천주교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의하여 장례를 치른다.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이나 장례 의식을 존중하여 병행하기도 한다.
※ 성사의 순서 :
고해성사 > 노자성체 > 병자 성사 > 임종 전 대사
[ 병자 성사 = 종부 성사 ]
환자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 입히고, 성유(聖油)를 바를 얼굴과 눈, 코, 입, 손바닥, 발바닥 등을 씻어 주고, 상위에 흰 천이나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십자고상(十字苦像)과 촛대, 성수그릇, 성수 채, 그릇 등을 준비한다.
신부가 도착하면 상위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고해성사(告解聖事 )하는 동안에는 신부와 환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난다.
[ 임종 전 대사 ]
환자가 숨을 거둘 때는 성촉(聖燭)에 불을 밝힌다.
※ 성촉이란 성랍(聖蠟), 즉 신성한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만든 초를 말한다.
* 기도문으로는 임종경(臨終經)이나, 성모덕시도문, 매괴경(玫瑰經)을 읽으며 기도문은 숨을 거둔 다음에도 얼마간 계속해서 읽는다.
*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환자의 마음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 흐느끼거나 통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성사의 순서 :
고해성사 > 노자성체 > 병자 성사 > 임종 전 대사
[ 병자 성사 = 종부 성사 ]
환자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 입히고, 성유(聖油)를 바를 얼굴과 눈, 코, 입, 손바닥, 발바닥 등을 씻어 주고, 상위에 흰 천이나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십자고상(十字苦像)과 촛대, 성수그릇, 성수 채, 그릇 등을 준비한다.
신부가 도착하면 상위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고해성사(告解聖事 )하는 동안에는 신부와 환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난다.
[ 임종 전 대사 ]
환자가 숨을 거둘 때는 성촉(聖燭)에 불을 밝힌다.
※ 성촉이란 성랍(聖蠟), 즉 신성한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만든 초를 말한다.
* 기도문으로는 임종경(臨終經)이나, 성모덕시도문, 매괴경(玫瑰經)을 읽으며 기도문은 숨을 거둔 다음에도 얼마간 계속해서 읽는다.
*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환자의 마음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 흐느끼거나 통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천주교식 식 진행 순서
초상
환자가 운명한 뒤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해준다.
* 손은 합장 시켜 묵주나 십자가상을 쥐어 주고 눈을 쓸어 감게 하며 입도 다물도록 해준다.
* 고인의 머리맡의 상위에는 십자고상(十字苦像)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성수 그릇과 성수를 놓는다. 입관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가족들은 옆에 앉아서 위령기도(慰靈 祈禱)를 올린다.
연미사
연옥(煉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로서,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이 사실을 바로 본당 신부에게 알리는
동시에 곧 미사 예물을 전하고 미사를 청하고 장례 날짜와 미사 시간을 신부와 의논하여 정한다.
염습과 입관
천주교 신도의 가정은 부탁하지 않아도 염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고인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다음 입관한다.
장례식
장례일에는 영구를 성당으로 옮겨 연미사와 사도예절(赦禱禮節: 고별식)을 행하여 입관과 출관, 행상, 하관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거행한다.
※ 장례식장 영결식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관
묘지 축성을 기도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수(聖水)를 뿌린 다음에 기도 하고 하관한다.
소기(小朞)와 대기(大朞)
장례 후 3일, 7일, 30일, 소기와 대기 때에도 연미사를 올리고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한다. 예전에 천주교 교인들은 초상때뿐 아니라 소기, 대기때에도 제례식 상례 중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점만을 취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께 간소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수시로 묘소를 찾아 잔디를 입히고, 성묘하는 것 등은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무방한 일이라 하였다.
환자가 운명한 뒤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해준다.
* 손은 합장 시켜 묵주나 십자가상을 쥐어 주고 눈을 쓸어 감게 하며 입도 다물도록 해준다.
* 고인의 머리맡의 상위에는 십자고상(十字苦像)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성수 그릇과 성수를 놓는다. 입관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가족들은 옆에 앉아서 위령기도(慰靈 祈禱)를 올린다.
연미사
연옥(煉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로서,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이 사실을 바로 본당 신부에게 알리는
동시에 곧 미사 예물을 전하고 미사를 청하고 장례 날짜와 미사 시간을 신부와 의논하여 정한다.
염습과 입관
천주교 신도의 가정은 부탁하지 않아도 염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고인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다음 입관한다.
장례식
장례일에는 영구를 성당으로 옮겨 연미사와 사도예절(赦禱禮節: 고별식)을 행하여 입관과 출관, 행상, 하관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거행한다.
※ 장례식장 영결식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관
묘지 축성을 기도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수(聖水)를 뿌린 다음에 기도 하고 하관한다.
소기(小朞)와 대기(大朞)
장례 후 3일, 7일, 30일, 소기와 대기 때에도 연미사를 올리고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한다. 예전에 천주교 교인들은 초상때뿐 아니라 소기, 대기때에도 제례식 상례 중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점만을 취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께 간소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수시로 묘소를 찾아 잔디를 입히고, 성묘하는 것 등은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무방한 일이라 하였다.

기독교
영혼을 죽음의 순간에 들 때부터 찬송과 기도로 하느님께 맡기는 의식이며 환자에게 성경이나 성가를 들려주어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운명한 시신의 정제수시(整濟收屍)에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 절차를 목사의 집례로 행합니다. 초종 중에도 매일 목사님의 집례 아래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유가족은 빈소에서 기도회를 가지며 찬송가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기독교 식 진행 순서
영결식
* 영결식은 영구를 교회 혹은 빈소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향대신 영전에 꽃 한 송이씩을 바친다.
* 일반 문상객을 위해 분향을 준비하기도 한다.
영결식 순서 (각 종파 및 목사에 따라 상이)
개식사(목사) -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시편 낭독 -> 신약 낭독 -> 기도 -> 고인의 약력보고 -> 주기도문 -> 찬송(모든사람들이 다같이) -> 헌화 -> 출관 (각 종파 및 목사에 따라 상이)
하관식 순서
개식사(목사) -> 기원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 기도 -> 신앙 고백 -> 취토 (喪主들이 흙 한줌씩 관 위에 뿌리는 것) -> 축도
* 영결식은 영구를 교회 혹은 빈소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향대신 영전에 꽃 한 송이씩을 바친다.
* 일반 문상객을 위해 분향을 준비하기도 한다.
영결식 순서 (각 종파 및 목사에 따라 상이)
개식사(목사) -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시편 낭독 -> 신약 낭독 -> 기도 -> 고인의 약력보고 -> 주기도문 -> 찬송(모든사람들이 다같이) -> 헌화 -> 출관 (각 종파 및 목사에 따라 상이)
하관식 순서
개식사(목사) -> 기원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 기도 -> 신앙 고백 -> 취토 (喪主들이 흙 한줌씩 관 위에 뿌리는 것) -> 축도

불교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법은 화장인데 이를 다비(茶毘)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장, 화장의 두 가지 장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장례방식은 임종에서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는 일반상례와 거의 비슷하나 임종염불이 있으며, 영결식 방법이 다르다.(임종염불 : 임종 후 다음세상에서 극락왕생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염불을 행하는 의식으로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임종염불 순서
분향 -> 삼귀의 -> 반야심경 -> 수계 -> 참회진언 -> 설법 -> 아미타경 -> 장엄염불 -> 왕생발원 -> 사홍서원
사용하고 있다. 장례방식은 임종에서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는 일반상례와 거의 비슷하나 임종염불이 있으며, 영결식 방법이 다르다.(임종염불 : 임종 후 다음세상에서 극락왕생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염불을 행하는 의식으로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임종염불 순서
분향 -> 삼귀의 -> 반야심경 -> 수계 -> 참회진언 -> 설법 -> 아미타경 -> 장엄염불 -> 왕생발원 -> 사홍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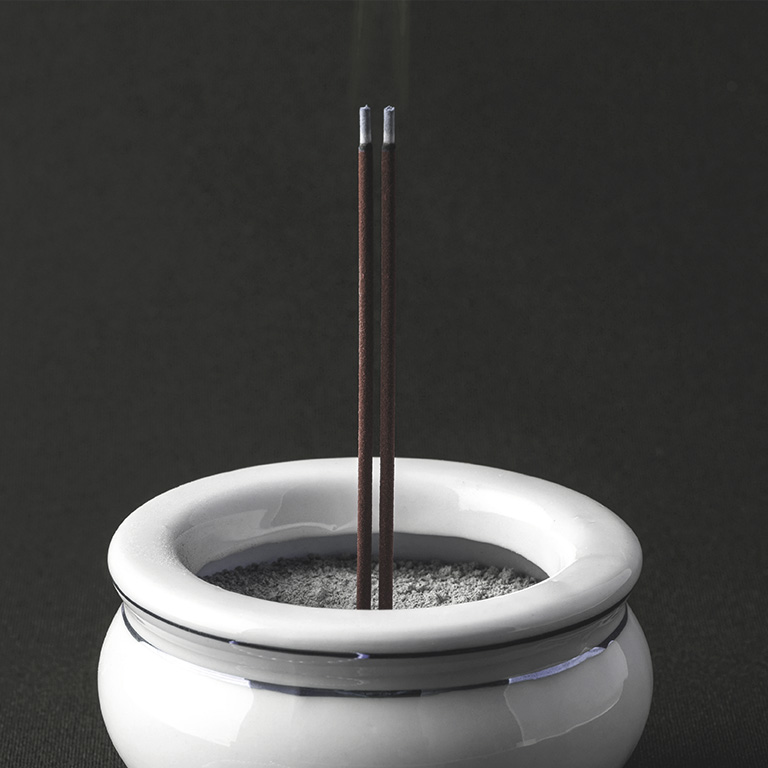
불교의 영결식 순서
1. 개식(開式) : 호상(주관)
2. 삼귀의례(三歸依禮) :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식
3. 약력보고(略歷報告)
4. 착어(着語) : 고인을 위해 스님이 부처의 가르침을 설법(說法)
5. 창혼(唱魂) : 극락 세계에 가서 편안히 잠들라는 것으로 스님이 요령(搖領)을 흔들며 故人의 혼을 부르는 의식
6. 헌화(獻花)
7. 독경(讀經) 스님과 모든 참례자가 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8. 추도사(追悼辭) : 초상 에는 조사(弔辭)라고 하며일반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다.
9. 소향(燒香) :참례자들이 향을 태우며고인의 명복을 빈다.
10. 사홍서원(四弘誓願) : 스님이 주관 중생무변 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은 끝닿는 데가 없으니 제도(濟度)해 주기를 맹세 번뇌무진 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번뇌를 끊기를 원하는 맹세 법문무량 서원학(法問無量誓願學)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불도무상 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
11. 폐식(閉式) : 영결식 끝났음을 선언한다.
2. 삼귀의례(三歸依禮) :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식
3. 약력보고(略歷報告)
4. 착어(着語) : 고인을 위해 스님이 부처의 가르침을 설법(說法)
5. 창혼(唱魂) : 극락 세계에 가서 편안히 잠들라는 것으로 스님이 요령(搖領)을 흔들며 故人의 혼을 부르는 의식
6. 헌화(獻花)
7. 독경(讀經) 스님과 모든 참례자가 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8. 추도사(追悼辭) : 초상 에는 조사(弔辭)라고 하며일반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다.
9. 소향(燒香) :참례자들이 향을 태우며고인의 명복을 빈다.
10. 사홍서원(四弘誓願) : 스님이 주관 중생무변 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은 끝닿는 데가 없으니 제도(濟度)해 주기를 맹세 번뇌무진 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번뇌를 끊기를 원하는 맹세 법문무량 서원학(法問無量誓願學)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불도무상 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
11. 폐식(閉式) : 영결식 끝났음을 선언한다.


